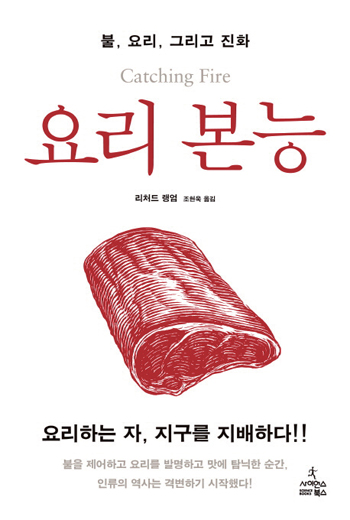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일등 공신은 ‘요리’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실제 주인공인 알렉산더 셀커크는 1704년, 항해 도중 선장과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무인도에 내린다.
4년간 무인도에서 생활한 그는 외관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야생의 모습을 지니게 됐지만, 야생동물처럼 날것을 먹고 소화할 능력은 없었다.
그는 갖고 내렸던 화약총으로 불을 피우며 음식을 익혀 먹었다.
그가 무인도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에 익힌 음식 덕분이었다.
화식이 아니었다면 그는 날음식의 독소와 기생충에 중독되거나 풀만 씹다 영양실조에 걸려 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며 진화 인류학자 리처드 랭엄은 신간 '요리 본능'에서 셀커크처럼 불로 먹을거리를 익히기 시작한 인류가 독보적이고 급진적인 진화를 겪게 됐다고 주장한다.
190만 년 전, 인류가 호모 하빌리스에서 직립 원인으로 진화한 계기는 일부 호모 하빌리스가 불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할 때부터였고, 그때부터 인류는 화식에 적응했다.
저자에 따르면 호모 하빌리스가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한 것은 불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부터다.
어두운 밤과 추운 겨울, 야생동물의 위협에서 인간을 지켜준 불을 집에 들이게 된 어느 호모 하빌리스가 우연히 사냥감을 불 속에 집어 던지게 되면서 익힌 고기의 맛을 즐기게 됐다는 설이다.
불에 그을린 동물의 뼛조각이 이를 증명한다.
익힌 음식은 부드럽기에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단단하고 큰 이는 인간에게 필요 없게 된 것.
익힌 음식은 소화도 잘되기에 소화기관 역시 작아졌다.
저자는 현재 인간의 외형을 통해 인간은 원래 육식을 하지 않는 채식가라거나 날음식을 그대로 섭취하는 생식가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논리를 '익힌 음식으로 인한 인류의 진화'라는 논거로 반박한다.
저자에 따르면 불에 익혀 먹는 행위는 인간의 해부학적 변화만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 사회 문화 전반에까지 변화를 일으키며 종 전체를 아예 타 동물과 떼어놓았다.
랭엄 박사는 음식을 불로 조리한 이후 축소된 소화기관 덕에 인간은 남아도는 에너지를 뇌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인간이 신체 비율상 다른 동물에 비해 큰 뇌를 지니게 된 이유다.
저자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큰 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준 건 요리라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육체의 보답으로 우리는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됐다.'고 풀이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일등 공신은 세간에 알려진 '직립보행'이 아니라 '요리'인 셈이다.
저자는 '요리'를 통해 원시인들은 '사회'를 이룩했다고 설명한다.
불가에 모여앉아 함께 사냥한 먹이를 나눠 먹을 줄 알게 되고 집단을 이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얘기다.
집단에서는 노동 분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사냥하는 남자와 이를 익히는 여자가 꾸리는 제도적인 결합 형태인 가정이 탄생했다.
이들은 함께 마을을 이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내심과 배려라는 덕목을 가슴에 새겼다.
요리의 중요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랭엄 박사의 글은 고고학, 생물학, 인류학, 역사를 넘나드는 풍부한 논거가 장점이다.

알고 싶어요, 이선희
'자유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대인의 일자리 종말 y It's a heartache, Bonnie Tyler (0) | 2017.03.17 |
|---|---|
| 대한민국은 교육 개혁이 최우선 과제 y 난 정말 몰랐었네, 최병걸 (0) | 2017.03.16 |
| 의사, 약사, 영양학자가 안 먹는 음식은? y 여름날의 추억, 남택상 (0) | 2017.03.10 |
| 장삿속 과잉 의료 유감 y 진정 난 몰랐네, 임희숙 (0) | 2017.03.08 |
|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 y 나 가거든, 조수미 (0) | 2017.03.07 |

